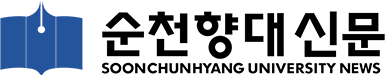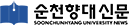의과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정부와 의견 충돌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오는 25일 전공의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던 한국 의료 시스템이 혼란을 맞은 가운데 의료진 없는 병원의 적신호가 곳곳에서 나온다.
의료계 파업은 지난달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히며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충돌로 시작됐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여러 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을 축소하거나 병동의 폐쇄·통폐합 등을 통해 비상진료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기존의 약 60%, 고려대 안암병원은 5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부산대병원은 40%로 지방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환자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담도암 진단을 받고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한 70대 암 환자가 전공의 파업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지고 바로 다음 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중증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중증환자들은 언제 자신에게 생길지 모를 긴급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외 경증환자들도 진료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체계로 버티고 있는 대학병원
한 달째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 중인 대학병원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보인다.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가 비교적 적은 병동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통폐합했다. 병동의 일시 폐쇄·통폐합으로 의료진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우선 재배치되었지만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 일정 지연 등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병동의 통폐합은 단순히 의료진 부족의 이유만은 아니다. 의료진 부재로 수술 및 입원환자가 감소하면서 경영악화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매출은 줄었지만 기존 비용이 그대로 투자돼 하루에도 수억 원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대형병원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통장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계를 버티지 못하면 한국 대형병원의 줄도산 가능성을 입 모아 말하고 있다.
병원의 공백을 채우는 간호사
전공의 파업 후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분배했다. 기존 전공의가 맡던 수술 및 검사 안내, 동의서 받기, 진료기록 및 진단서 작성 등의 업무가 적절한 교육 없이 간호사들에게 전달됐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원장과 간호부서장이 합의를 통해 업무 범위를 조절해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보호 절차와 법적 보호망이 없어 간호사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20일 정부는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32개 대학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도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사태에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건 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히며 집단행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가 변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에 환자들의 불안함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대규모로 이탈한 올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 사망률이 치솟을 것이라 예상한다. 의료계 정상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의 보건안전에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